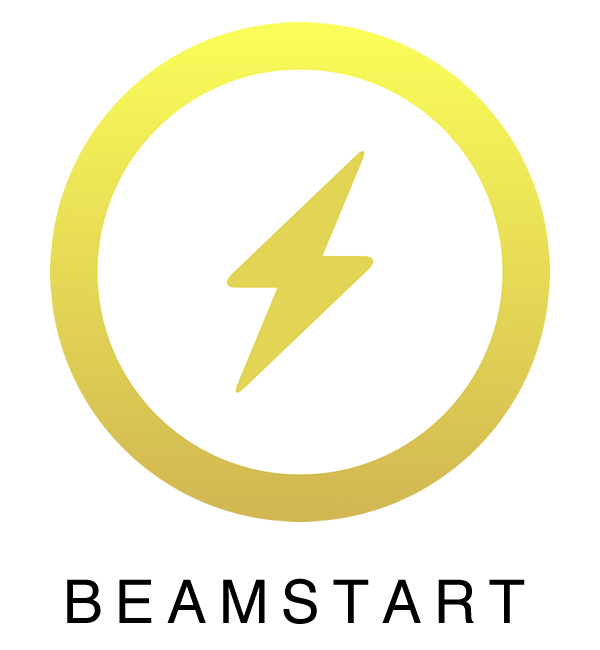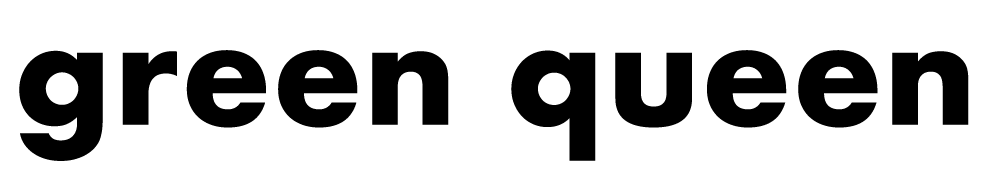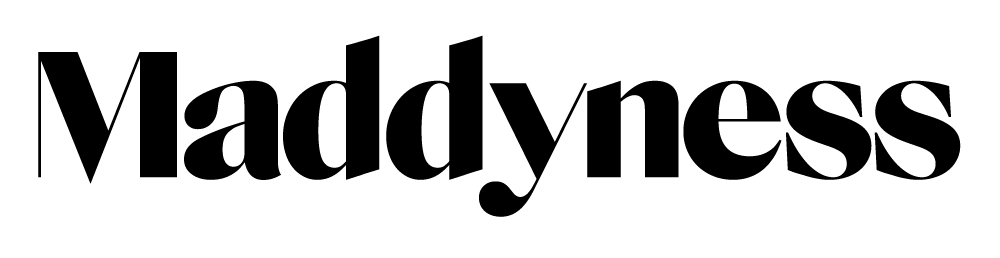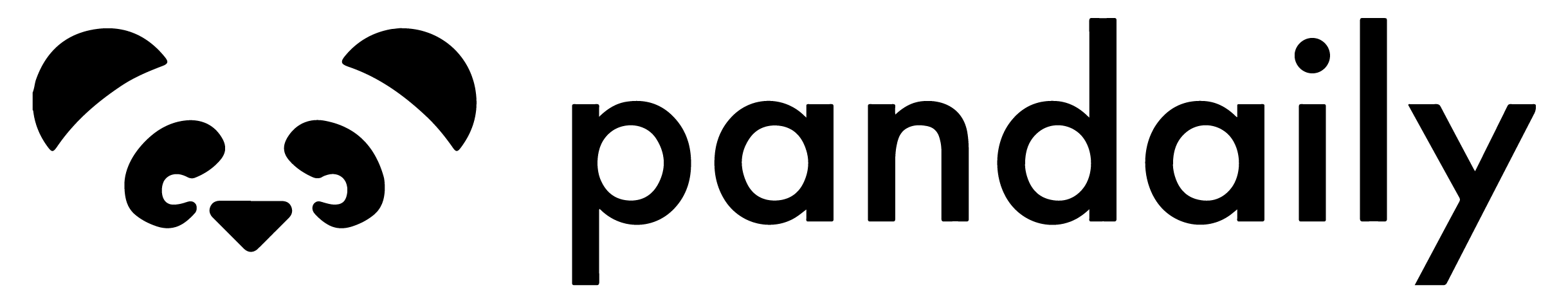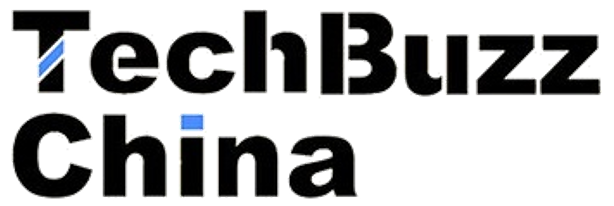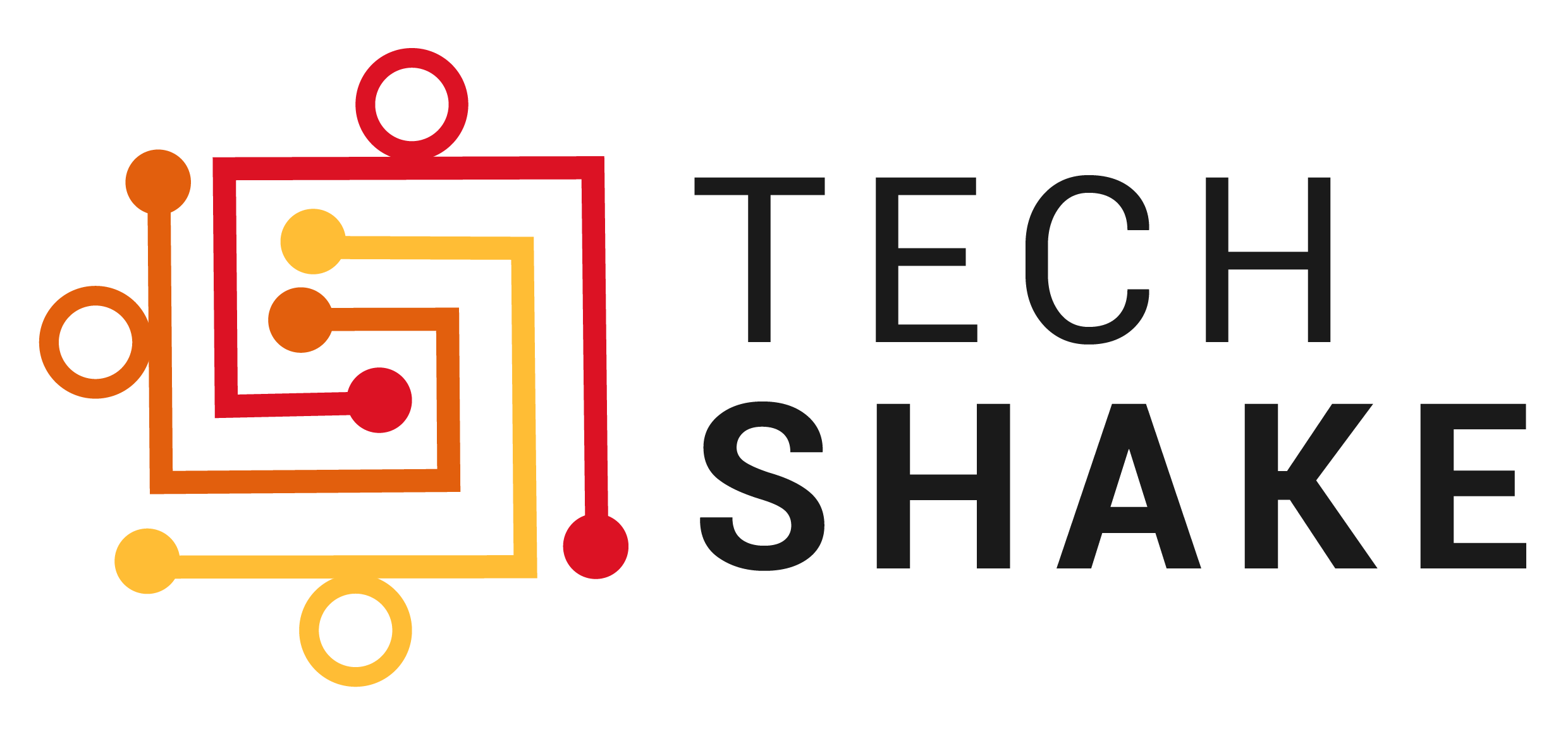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나 공익단체에 의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농가에 분할 납부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6억 명이 안정적인 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다. 이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농촌 지역으로의 송전망 확장이 경제적으로 파탄났기 때문.
기존의 송전망 개발 전략은 집중형 발전소 건설, 수백 km에 이르는 송전선 부설, 수백만 가구에 전력 공급. 요금 징수라는 4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이는 1930년대 미국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그 이유는 노동력이 저렴하고 자재는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등 다양하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가까운 포장도로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연소득 600달러인 농가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 송전망 개발 전략이 잘 작동할 리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촌 지역 1가구에 송전망을 부설하면 드는 비용은 266~2,000달러다. 농촌 지역 1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한 달에 10~20달러이기 때문에 송전망 부설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3~200개월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는 15억 명이 수입 중 최대 10%를 등유나 경유 등 연료에 쓰고 있다.
이런 아프리카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다. 태양광 패널 가격 변동을 정리해보면 1와트당 가격이 2020년에는 0.3달러까지 감소했으며 지난 45년간 99.5% 줄었다.
게다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격은 2008년에는 5,000달러로 케냐 도시 지역 부유층만 구매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120~1,200달러로 소규모 농가도 구매 가능한 가격대까지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에서 이용하는 배터리 비용도 90% 하락했으며 인버터나 LED 전구 비용도 놀랄 만큼 하락했다. 또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로 아프리카의 물류망도 놀랄 만큼 개선됐다고 한다. 이런 트렌드는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오프그리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제성은 갑자기 우수해졌다.

아프리카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에 한몫한 또 다른 요소가 스마트폰에서의 개인 간 송금 보급. 발단이 된 건 2007년 케냐의 통신 사업자인 사파리콤(Safaricom)이 시작한 SMS 경유 송금 시스템인 M-PESA다. M-PESA 등장으로 2025년까지 케냐인 70%가 모바일 머니를 이용하게 됐다. 이는 은행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케냐인에게 친숙하다고 한다. 케냐에서는 인구 1인당 모바일 머니 거래량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M-PESA가 성공을 한 이유는 송금 수수료가 매우 저렴했기 때문. M-PESA는 거래 비용이 거의 0원이기 때문에 소액 거래라도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이로써 아프리카에서 유행 중인 자금 조달 모델인 사용한 만큼 지불(Pay-As-You-Go)하는 구조가 탄생했다.
PAYG가 등장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판매 모델로서 다음 길이 열렸다. 이로써 고객 90% 이상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30개월에 걸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M-PESA와 같은 송금 시스템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판매 모델이다.
회사가 사용자 집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하고 계약금은 100달러를 낸다. 이 후 24~30개월간 월 40~65달러로 이용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자택에 전화를 거는 GSM 칩 탑재하고 지불이 끊기면 원격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원이 꺼진다. 지불이 계속되는 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용할 수 있다. 30개월이 경과하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사용자 소유물이 되어 영구적으로 무료로 전력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판매 모델로 아프리카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에 큰 역할을 한 스타트업 중 하나가 썬킹(Sun King)이다. 이 회사는 2023년 2,300만 개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을 판매했으며 42개국에서 고객 4,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취급 제품은 솔라 램프나 배터리, 조명 등이다.

또 다른 기업이 썬컬처(SunCulture)다. 이 회사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개용 펌프나 IoT 지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PAYG 융자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썬컬처 등장으로 농작물 수확량은 3~5배 증가했으며 농가 수입도 1에이커당 600~1만 4,000달러 증가했다고 한다. 썬컬처는 4만 개 이상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 건수는 4만 7,000건 이상으로 소규모 농가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썬컬처 관개용 펌프는 디젤 연료가 아니라 태양광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펌프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9톤이나 줄이는 데 성공했다. 썬컬처 관개용 펌프 도입 대수는 추정 4만 7,000대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13만 6,000톤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탄소배출권도 존재한다. 썬컬처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한 아프리카 첫 태양광 발전 관개 기업으로 감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톤당 15~30달러에 판매 가능하다. 탄소배출권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전력 인프라로서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변모했다는 지적이다.
20세기 인프라 모델이 집중형 발전, 정부 주도, 거대 프로젝트에 의한 자금 조달, 30년 단위 타임라인, 독점적인 공익사업이었던 반면 21세기 인프라 모델은 분산·모듈형, 민간 주도, PAYG 파이낸스, 며칠, 몇 주라는 신속한 도입, 경쟁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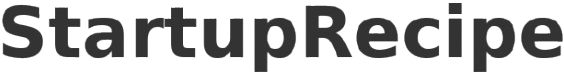
![[AI서머리] ‘AI 서밋 서울 & 엑스포 2025′ 개막‧’센서블 시티 서울 랩’ 공식 출범](https://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5/11/251110_saif.or_.kr_0030503253-75x75.jpg)
![[AI서머리] 젠엑시스, 대구 C-Lab 17기 액셀러레이팅 성과‧마이리얼트립, 2025년 여행 트렌드 발표](https://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01/260115_genaxis.co_.kr-600758586-350x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