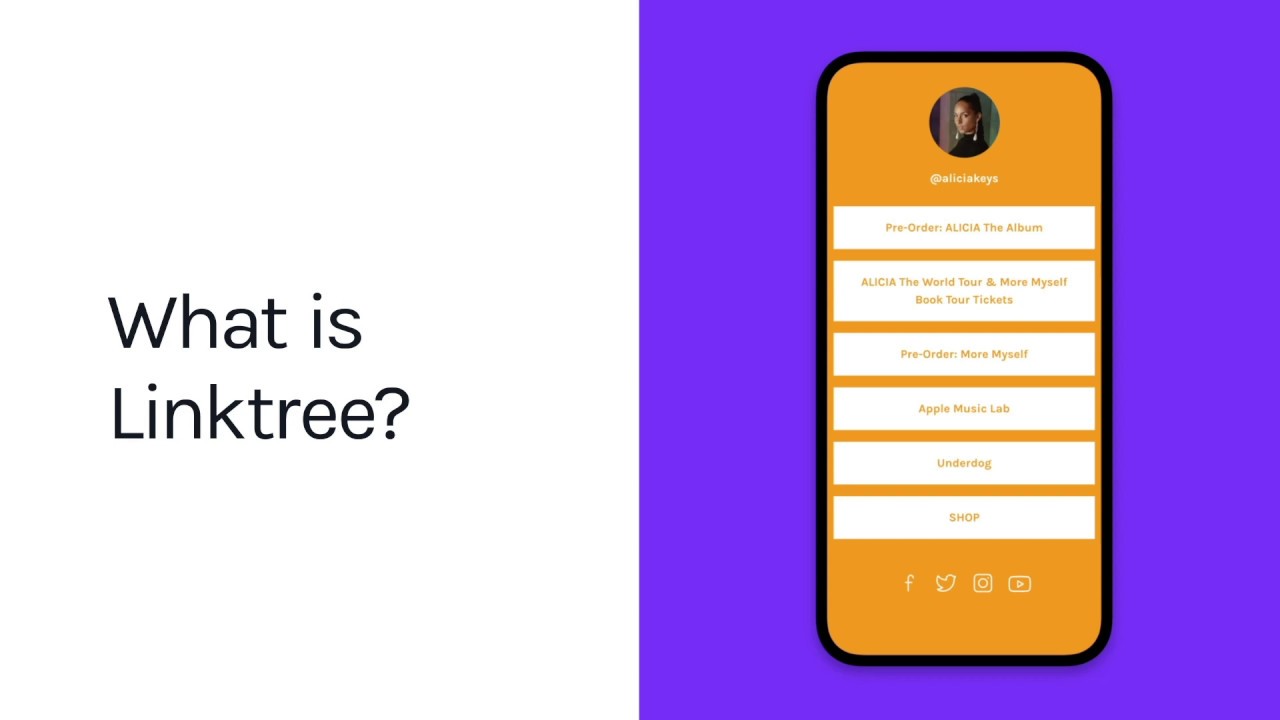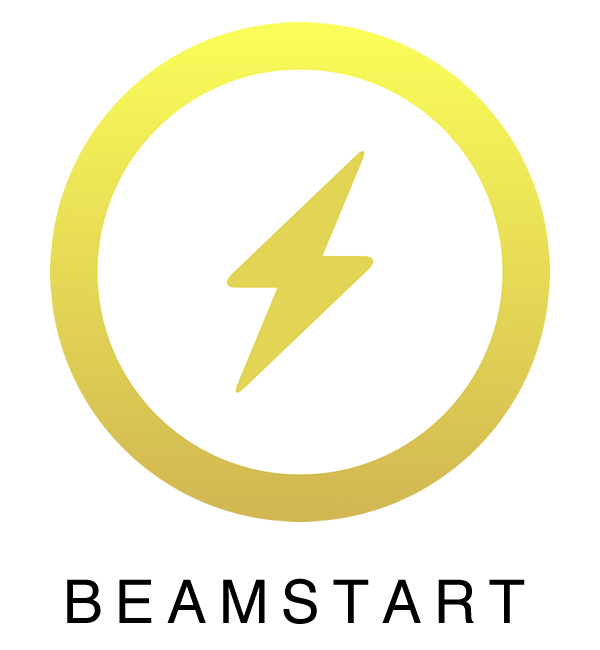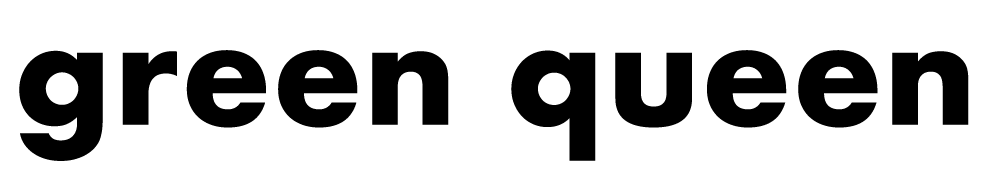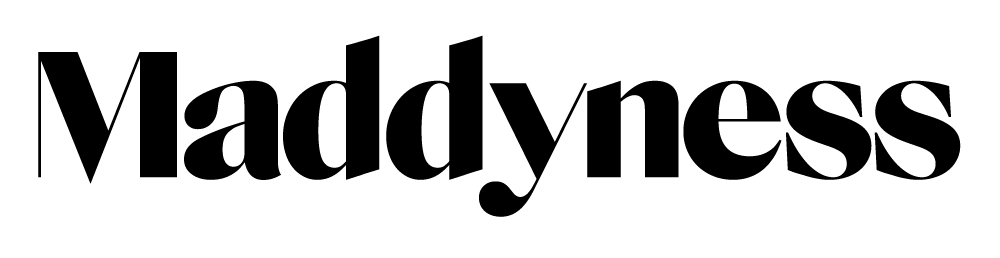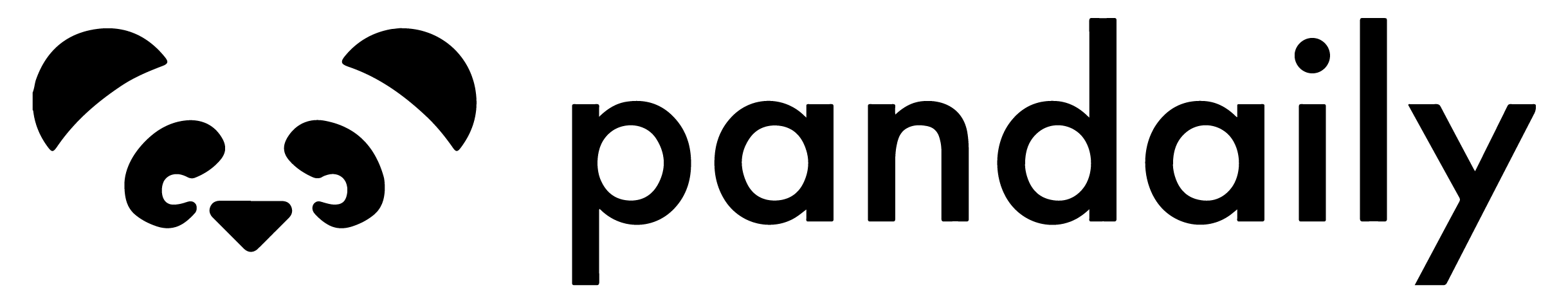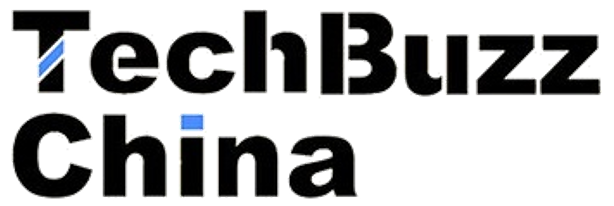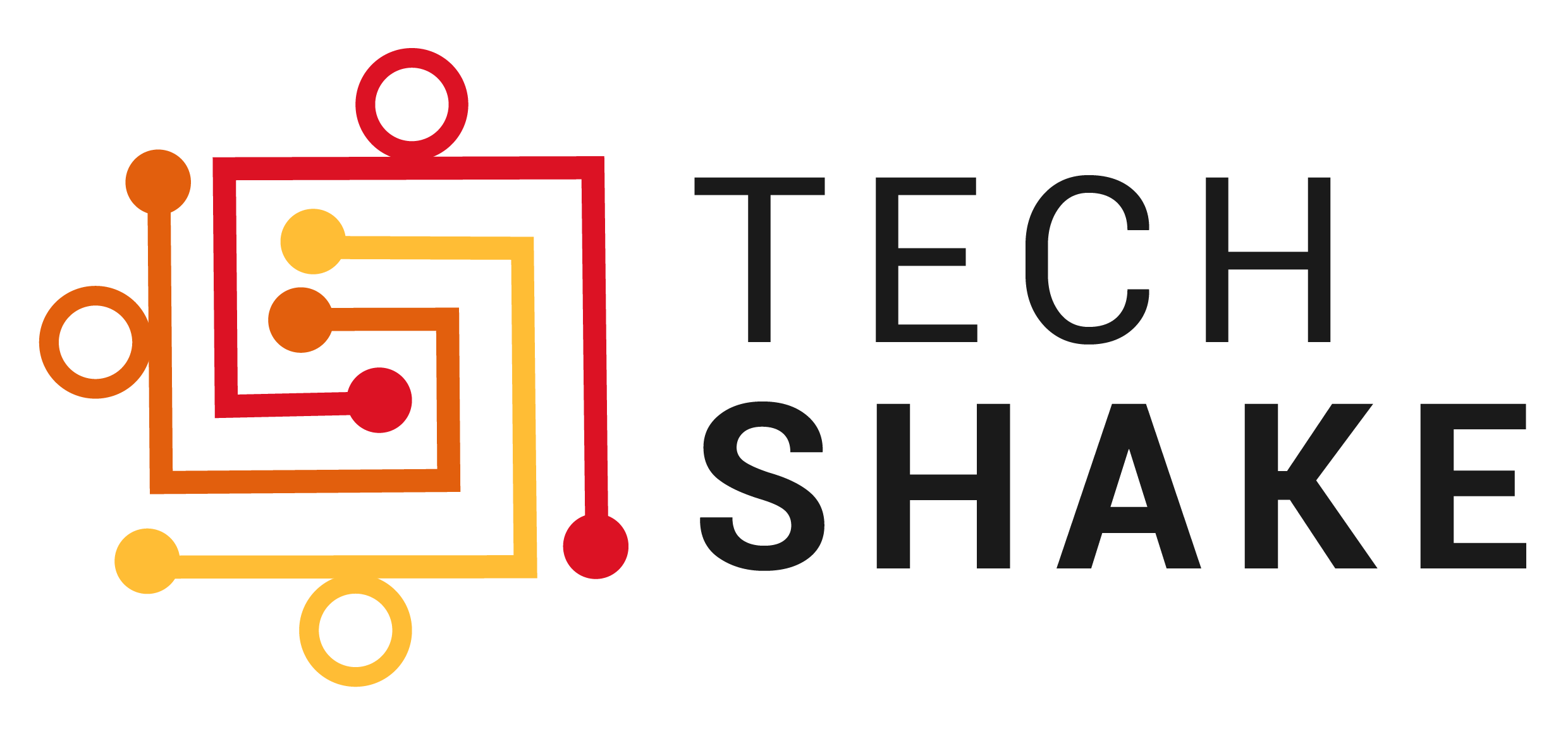이번 주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지자체의 인공지능(AI)·벤처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팹리스 육성 전략, 벤처투자 구조 개선 논의가 주를 이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 문턱을 낮췄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를 500억원으로 하향했다. 창업기획자의 경영 지배 목적 투자를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고, M\&A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의무를 완화했다. 이는 창업·성장·인수 단계 전반에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PU 서버 이용과 제조기업의 AI 전환 사업화를 지원한다. GPU 자원은 추경을 통해 75개사 추가 지원하고, 제조기업 20곳에는 AI 전환 로드맵 수립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28억원 규모의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을 추진해 업종별 6개 컨소시엄을 선정, 제조 현장에 AI 솔루션을 적용한다.
벤처투자 구조의 수도권·후기기업 편중 문제도 부각됐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기업 비중은 40%지만 투자 비중은 20%에 그쳤고,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는 전체의 18.6%에 불과했다. 이에 권역별 지역특화 펀드 신설과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 확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이 제안됐다.
무역협회는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이 메모리에 집중돼 있고,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전 세계 팹리스 스타트업 중 한국 비중은 3.8%로 중국·미국에 크게 뒤진다. 보고서는 설계·평가·생산 생태계 강화, 수출 인증 완화, 팹리스-파운드리 연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벤처·코스닥·VC 3개 단체의 공동 제안도 나왔다. 혁신기업 진입을 유연하게 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며, 법정 기금과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장기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본법 제정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규제보다 진흥 중심의 법제화와 대규모 연구개발·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를 개최한다. 지난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해 200개 도시, 300개 기업, 6만명 참여를 목표로 AI·스마트시티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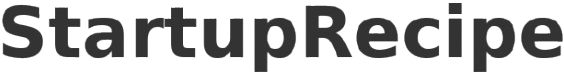

![[DailyRecipe] 최대 1.2억…관광벤처 100개사 모집 시동](https://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02/260203_tourism_ai_00000002-350x250.jpg)
![[DailyRecipe] 자동차 산업에 4,645억 배정…이 분야에 투입한다](https://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02/260205_Industrial-Robots-in-Automotive-Manufacturing_ai_00002-350x250.jpg)